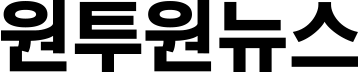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국정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권력은 책임 있게 행사되어야 하며, 정쟁은 민생 앞에서 절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는 기대보다 불안이, 신뢰보다 피로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가 아니라, 이 나라 정치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 물음이다.
무엇보다 정치의 언어가 거칠어졌다. 타협과 조정은 사라지고, 극단적 대립과 정쟁만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는 법과 제도를 논의하는 숙의의 장이 아니라, 힘겨루기와 장외투쟁의 연장선처럼 비쳐진다. 정치는 문제 해결의 기술이어야 하지만, 오늘의 정치는 갈등 확대의 기술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 사이에서 국민은 피로해지고, 국정은 지연되며, 국가적 과제들은 표류한다.
더 큰 문제는 민생의 체감 온도와 정치의 관심 온도 사이의 괴리다.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서민의 삶은 팍팍해지며, 미래 세대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시선은 정략적 이해관계와 권력 지형에 과도하게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준다. 국민이 체감하는 위기와 정치가 반응하는 위기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은 구조화될 수밖에 없다.
정치 불안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국가 리스크로 이어진다.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대외 신뢰도가 낮아지며, 경제·외교·안보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폭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속적이다. 그럼에도 정파적 유불리가 국가 장기 전략을 압도하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
민주주의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갈등을 관리하고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대화가 단절되고, 협치가 실종되며, 상대를 ‘제거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치 문화가 고착된다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국민이 걱정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다.
이제 정치권은 답해야 한다. 국민이 왜 불안해하는지, 왜 정치를 걱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첫째, 민생을 정쟁 위에 두겠다는 실질적 행동이 필요하다. 둘째, 입법과 국정 운영에서 최소한의 초당적 협력 복원이 시급하다. 셋째, 권력 행사의 절제와 책임 정치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말이 아니라 제도와 결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은 완전한 정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불안하지 않은 정치를 원한다.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으며,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라면 갈등 속에서도 신뢰는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치가 불안의 진원지로 인식된다면, 민주주의의 토대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만드는 현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정치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