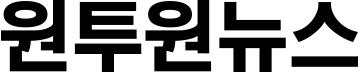새해애도 어김없이 '내로남불'이 일상화 되는 느낌이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목소리가 권력의 중심에 서는 순간 달라지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 자주 목격해 왔다. 남에게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는 무한한 관용을 베푸는 태도. 이른바 ‘내로남불’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구조적으로 고착된 병리 현상이 되었다. 문제는 그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는 비판의 대상이었던 일이 오늘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된다. 과거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던 사안이 입장이 바뀌면 ‘정무적 판단’으로 둔갑한다. 원칙은 상황에 따라 접혔다 펴지는 선택지가 되었고, 기준은 적용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일관성은 사라지고, 국민의 판단 기준은 혼란에 빠진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에서는 책임 회피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사법 영역에서는 선택적 엄정함이 의심을 낳는다. 언론과 시민사회를 자처하는 일부 영역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문제에는 침묵하거나 논점을 흐리는 일이 적지 않다. 비판의 잣대가 공익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때, 그 피해는 결국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내로남불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한 위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의 신뢰 자본을 잠식한다. 같은 법과 규칙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시민들은 규범을 지킬 이유를 잃는다. 성실함은 손해가 되고, 편법은 요령이 된다. 공동체를 유지해 온 최소한의 도덕적 합의가 흔들리는 순간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이 점점 의사결정의 주체에서 배제된다는 점이다. 정책은 설명 없이 추진되고, 결과는 사후 통보로 대신된다. 의문을 제기하면 ‘정치적 의도’로 몰리고, 비판하면 ‘갈등 조장’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국민은 주권자라기보다 관리와 통제의 대상처럼 취급받는다. 헌법에 명시된 주권은 현실에서 실종된 듯 보인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다. 말과 행동이 반복해서 어긋나는 권력, 자신에게는 예외를 허용하는 지도층을 국민이 신뢰하기란 불가능하다. 지도자의 언어가 공허한 수사가 되는 순간, 국정 운영의 정당성 역시 흔들린다. 권위는 직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책임에서 비롯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나 더 자극적인 언사가 아니다. 같은 기준, 같은 잣대, 같은 책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의 회복이다. 비판의 칼날을 남에게만 겨누지 않고, 스스로에게 먼저 들이대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출발점이다. 책임을 인정하고 설명하며, 국민을 설득의 대상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떤 개혁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내로남불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주권자가 실종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관객이 아니다. 정책의 대상도, 통제의 객체도 아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은 그 위임을 받은 존재일 뿐이다. 그 단순한 진리가 다시 상식이 될 때, 무너진 신뢰 역시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